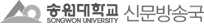올봄 병실 앞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로 한층 다가서고 있다. 무더웠던 여름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세월은 여름에만 머물지 않도록 힘겹게 지나가고, 지금은 삭풍으로 쌀쌀함이 가득하여 지난 계절을 무시하고 먼저 와버린 느낌이다.
떨어지다 남은 노란 은행잎이 싸늘한 겨울바람에 소리 없이 뚝 떨어진다. 12월의 거리는 늘 우리를 슬프게 한다. 꽃도 나무도 햇빛도 없이 빈 가지에 앙상하게 달린 고엽처럼 쓸쓸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마지막 달에는 괜히들 몸과 마음이 바빠지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세모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니 달려간다고 말하기보다는 시간이 내 안에서 급속히 빠져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특히 올해 마지막 달은 작년까지와는 달라 늘 보이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먼 과거만 보인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 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이는 한해였다.
하지만 세모 풍경을 잘 자아내는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같이 12월에는 연탄 한 장처럼 누군가에게 뜨겁고 길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연탄재가 거의 사라진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위한 길을 다듬는 역할에 충실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연탄재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발로 차지마라’에 나오는 시이다.
마지막 달은 나를 전부라도 태워, 님의 시린 손 녹여줄 따스한 사랑이 되고 싶다. 그리움으로 충혈된 눈 파랗게 비비며, 님의 추운 겨울을 지켜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박눈 펑펑 내리는 날, 님께서 걸어가실 가파른 길 위에 누워, 눈보다 더 하얀 사랑이 되고 싶다. ‘冬至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내어)/ 春風 니블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정든 임이 오시는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처럼 말이다.
12월에는 선친께서 유별히 즐겨 드셨던 홍시를 보면 절로 박인로의 ‘조홍시가’가 떠오른다. 이 시조만큼 효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도 흔치 않다. ‘반중(盤中)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 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유독 옛날의 겨울밤은 지금보다 더욱 길게 느껴졌다. ‘뒷산 소나무 숲에서 메마른 바람이 어머니를 이끌고 왔습니다 젖가슴 같은 두 언덕에 머물러 손자며느리 보듬고 계셨습니다 나는 잠시 바람의 여정을 그려보며 고단한 삶을 내려놓았지요 어머니는 기차에 몸을 싣고 휴전선을 넘나들며 만주벌판까지 갔을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투명하고 보이지 않아서 사람 따위에 신경 쓰시지 않아 좋겠지요 당신이 묻히고 온 누런 먼지는 어쩐지 해묵은 솜이불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겨울이 오면 큰 방에 넓게 깔아놓아 솜이불을 뜯어냈습니다 풀 먹이고 다듬이질하여 바삭바삭 소리가 들리는 이불솜으로 걷어내 긴 겨울밤을 그 속에서 꿈을 꾸며 지냈지요 막걸리를 드신 아버지는 하얀 눈을 치우시고 푸른 대나무 숲을 빠져나와 봄을 맞이하셨지요 어느 날 긴긴밤 이불솜을 바느질하며 끄응하는 신음소리에 어둠은 더 깊어가고 있었지요 나는 그 소리가 빛을 잃고 뒷산 소나무 숲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달빛이 문지방 밑으로 들어오고 더 이상 바느질하지 못한 다음에서야 긴 겨울밤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긴 겨울밤’이라는 자작시를 낳게 하였다.
세모가 다가오면 다른 무엇보다도 풍경이 내 맘을 설레게 하는 때가 있지요. 창가에 앉아서 흰 눈이 내리는 밖을 바라본다던가, 어느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날, 아니면 어느 여행지에서 흰 눈으로 뒤덮인 산을 바라볼 때 괜시리 감성이 물씬 풍겨 나올 때가 있다. 주말이면 허물없이 만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삶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김치 깍두기 청국장 냄새가 좀 나더라도 별 상관없이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 내가 머물던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눈 내리는 밤이나 바람 불고 비오는 저녁에 너덜거리는 구두를 구부려 신고 만나러 가도 반기는 사람, 깊어가는 밤을 벗 삼아 서로의 공허한 마음도 확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약간의 심술을 부리면서 남의 얘기도 주고받아도 말이 나고 탈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한 해가 저문다/ 파도 같은 날들이 철썩이며 지나갔다/ 지금, 또 누가/ 남은 하루마저 밀어내고 있다/ 가고픈 곳 가지 못했고/ 보고픈 사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생활이란 게 그렇다/ 다만, 밥물처럼 끓어 넘치는 그리움 있다/ 막 돋아난 초저녁별에 묻는다/ 왜 평화가 상처와 고통을 거쳐서야/ 이윽고 오는지를…/ 지금은 세상 바람이 별에 가 닿는 시간/ 초승달이 먼저 눈 떠, 그걸 가만히 지켜본다’ 엄원태 시인의 ‘세모’에 나오는 시이다.
겨울은 입을 다물고 흐린 그림자는 말을 삼키며 삼라만상은 죽은 듯 마비되어 있다. 모든 물체들마다 자기만의 언어로 생각하고 반성하여 수행하는 것은, 그리운 봄에 수많은 언어들을 토해내기 위해서다. 찬바람 불고 눈보라치지만 꽁꽁 얼어붙은 땅 밑은 새 봄을 장만하는 희망의 세계가 또 있기에 나는 그저 바람 불고 눈발 날리는 광경을 바라 볼 뿐이다.
-
넌 너여서 아름다워2015.05.31
-
겨울여행201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