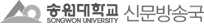이영일 / 중앙도서관장
어느덧 꽃이 지며 봄날은 가고 있네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깨닫는 순간 그 아쉬움이라니. 그러나 참 깨끗하게 가야 할 때를 알고 군소리 없이 지는 꽃들 또 내년 봄 기약하게 하는군요. ‘꽃이 지고 있습니다/ 한 스무 해쯤 꽃 진 자리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일 마음 같진 않지만/ 깨달음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깨침에 꽃 피었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린/ 저기 저, 발가숭이 봄!/ 쯧쯧/ 혀 끝에서 먼저 낙화합니다’ 김종철 시인의 ‘봄날은 간다’에 나오는 시이다.
그런데 인간사의 낙화란 글쎄 쯧쯧 혀끝에서 먼저 지고 있나봅니다. 지난 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잊음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 토막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을까. 이제는 자질구레하고 번잡한 것들보다는 근본적이고 안전한 뭔가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죽음과 삶의 문제, 시공간도 우주로 확대해야겠지요.
유월이 오면 사물들은 벌써 뻔뻔스러워진다. 유월의 자연은 이미 여름 속으로 성큼 들어가 그사이 충분히 빨아올린 대지의 양분으로 짙은 초록색으로 변한다. ‘사르르 눈 감으면/ 파도소리 들리는 계절/ 푸른 가슴 열면/ 꿈 많던 시절의 바다가 있고/ 철없던 시절의 그대와 내가 있지요// 여름이 오면 왠지 들뜨는 기분/ 바다와 그 바다의 추억이 그리워서일까요/ 곱게 접어둔 마음 한자락으로 스치는/ 만나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들/ 물안개 자욱한 옛 길을 걸어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의 노래/ 하얀 물보라의 여운이 가슴을 적셔요/ 돌아가고 싶은 동화의 나라/ 그 나라에 아직도 파랑새가 살고 있지요/ 진주 같은 눈망울에 구름 같은 미소로// 수평선 아득한 세월에도/ 갈매기 날으는 또 하나의 꿈을 그리며/ 마주앉은 동심으로 모래성을 쌓고 싶어요/ 쌓다가 부수고 또 쌓으며/ 서산 노을빛이 해변에 물들면/ 우리 서로 모래를 털어주기로 해요’ 이채 시인의 ‘그대에게 띄우는 여름편지’이다. 유월은 대학생들에게는 참 경외스러운 달이다. 인생의 황금시대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유월이 오면 향기로운 풀섶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며, 솔바람 부는 하늘에 흰 구름이 지어놓은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를 위하여 노래 부르며, 온종일 달콤하게 지낼 수 있으니 말이다. 젊음의 바람타고서 사랑의 메아리가 들리는 듯 살랑살랑 떠오르며 가슴이 아늘아늘해지는 달이다. 여기에 시원한 파도소리 들리는 바닷가,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섬에서 해 길어진 하지의 햇살아래, 암수 한 쌍의 새가 꽃나무에 앉아 구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면 사랑, 기쁨, 감사의 등불을 마음에 걸어주려는 신의 마음인 것 같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확실히 세상이 바뀐다. 하늘도 땅도 바뀌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도 바뀐다. 태양도 바뀌고 달도 바뀌고 모든 별들의 반짝임도 바뀐다. 이처럼 세상이 바뀔 필요가 있을 때 신은 인간의 가슴에 사랑을 내리는가 보다.
너는 죽어 별이 되고/ 나는 살아 밤이 되네// 한 사람의 눈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통곡하는 밤은 깊어// 강물 속에 떨어지는/ 별빛도 서러워라// 새벽길 걸어가다 하늘을 보면/ 하늘은 때때로 누가 용서하는가// 너는 슬픈 소나기/ 그리운 불빛/ 죽음의 마을에도 별은 흐른다’ 라는 정호승 시인의 ‘여름밤’처럼 여름을 맞아 아늘아늘한 삶의 마음을 달래주어 수많은 우리들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준다.
하지만 지난봄은 너무도 잔악한 세월이기도 하다.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사랑을 말하지 않을 곳에서/ 사랑을 말할 때가 있다// 눈물을 보이지 않을 곳에서/ 눈물을 보일 때가 있다//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보낼 때가 있다/ 떠나보내지 않을 것을/ 떠나보내고/ 어둠속에 갇혀/ 짐승스런 시간을/ 살 때가 있다’ 며 이근배 시인은 노래하지 않는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처럼 사는 건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선택이 완벽하지만은 않아서 늘 후회가 남는다. 그러나 어쩌랴. 그것이 인생인 것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을 떠나보내고’ 아쉬움과 슬픔에 평생을 후회하는 게 인생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후회가 없다면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여름을 앞두고 나는 제 생에 두 번의 대수술을 하였다. 병마는 내게 큰 스승이 되여 ‘함께 하는 삶’이란 교훈을 안겨주었다. ‘내 육체에 대한 신비가 살아나면서/ 그간 삶의 내력이 오히려 애틋하다// 나의 몸부림과 그리움과/ 영혼 부시는 소리가/ 먼 나라를 스쳐온 것 같다// 농로와 언덕과 솔밭 길을 헤매며/ 내가,/ 얼마 전에/ 부대끼고 스적인 것이 만져진다// 나의 도두룩하게 파인/ 얼굴 주름에는/ 대지의 아들로 살아온 내력이 달갑다/ 우리가 함께 살자고 읊은 흔적이/ 언제부터였던가’라는 자작시를 낳게 해 주었다.
그간 치열하게 살았다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선택을 했다면 후회는 따라오는 것이 이치이지만 그래야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처럼 삶의 남풍이 불어올 것이 아닌가.
광활히 펼쳐진 대자연과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훈훈한 풍경. 햇살 아래 미소짓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흘러나오면서도 부러운 마음이 든다. 유월이 오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둔 것처럼 마음 곳곳에 따스함이 배어오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몸 밖으로 스며나가 볼에 물들이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하자.
지난 세월은 후회하자, 멋지게 후회하자. 그간 고통스러워 외면했던 내면의 삶을 이제는 바로 쳐다보고 비 갠 다음 날의 하늘처럼 창창할 거라 믿어보자. 잔인했던 봄바람이 불어온 후 방향을 알 수 있었고, 삶의 불확정한 요소들을 집요하게 응시하여 매듭진 불안의 징후들을 떨쳐버리자. 그래서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고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아침 해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며 녹음 짙은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어떨는지…
-
한학기를 되돌아보며2014.06.16
-
이제는 시간표를 바꾸자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