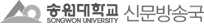효율성이 아닌 진정성으로시론조회수 4860
관리자 (chambit)2014.01.08 09:42
이영일 / 철도운수경영학과 교수
“백리를 달려 남도로 달려가면/ 비가 새어들고 바람이 들이치는 옛집에/ 절뚝거리며 마중 나오는 성자가 산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그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고도/ 더 못 주어 안타깝다던 그 사람/ 그가 있어 세상은 살만했고/ 생은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좋았다/ 수백 번 자신이 팔렸음에도/ 한 번도 못난 자식을 탓하지 않았다/ 신은 자신의 사랑을 전할 길 없어/ 이 땅에 그를 대신 보내 주셨다/ 고향에는 성자가 산다/ 발을 절며 서울 가는 나를 마중하는/ 늙은 예수가 산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이때쯤이면 난 고향집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이 시는 김용원이 지은 ‘고향에는 성자가 산다.’라는 글이다. 고향집에는 어머니라는 성자가 살며 인간 형상을 하고 인간의 삶을 살지만 자식들에게만은 성자다. 그 성자는 자식의 허물을 자기 허물로 알며, 자식이 아무리 자신을 배신한다 해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결국 자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상 밖으로 사라져간다. 정말 애절한 시이다. 이처럼 어머니는 늘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8Km 떨어진 읍내 학교에 다녔다. 이른 새벽에 어머니가 지어주신 아침밥을 먹고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와 산길을 가로질러 갔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헌 자전거를 구입하여 통학을 하였다. 그러나 가끔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청 춥거나 더울 때는 2Km 떨어진 신흥부락 정유소에서 버스를 타기도 하였다.
내가 태어나서 유년을 보낸 곳은 농촌의 꽤 큰 마을이나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다.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다녔고,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선 버스가 제 때에 시간을 지키지 않아 여유 있게 정류소에 미리 가 한참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두려움이다. 오랫동안 기다려 버스를 타려고 손을 들어도 그냥 가버릴 때가 있었으니까. 내가 기다린 정류소에서 내릴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 말고도 버스를 기다린 어른이 있으면 안심이었다. 그러나 나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내릴 사람도 없으면 버스는 서지 않고 야속하게 부응하면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중간지점이라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두려움을 항상 지닌 채 버스를 기다려야만 한다. 버스를 타지 못하면 오십분 후에나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각하기 마련이다.
버스기사는 내가 지불하는 요금이 학생인 관계로 반액 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혼자이니 학생 한명 태우느라 귀찮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한다.
오랜 시간동안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냥 내 앞을 스쳐가 버릴 때 나는 허무하고 슬픈 마음으로 버스의 뒤꽁무니를 우두커니 바라보아야만 했었다. 그때 나는 무언가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사회에 대해 아주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기초적이고 보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그때부터 곰곰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던 후로 난 막연하나마 현상적인 사회가 기초적이고 보편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에 대하는 방식이 내 가족 특히 부모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에게서는 내가 그 어느 것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부모도 특히 우리나라 부모는 자기 자식을 ‘효율성’에 의해서 키우지 않을 것이다. 자식이 어떤 형태를 지녔든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내외적 품성과 성취의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회는 각자의 개별적 품성과 성취에 보편적 그 이하의 관심 밖에 아니 전혀 없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영금지 경고판을 보고 있노라면 한 생명을 구하려는 진솔함보다 경고를 통한 자기 직책의 어쩔 수 없는 책무이거나, 아니면 사건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변명하는 구실인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더구나 처벌의 두려움을 앞세우는 것 같은 글귀를 읽노라니 문득 웃다가도 슬픔이 좁은 문틈 속에 내 던져진 채로 불현듯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인가.
어쩌면 이 땅에서 산다는 건 잠깐 웃다가 곧바로 슬퍼지고 그러다가 섬뜩 두려워지는 일인지도 모른다. 수영금지 경고판에 있는 글귀처럼, 학창시절에 효율성이라는 전제아래 오랜 시간동안 두근거리며 기다리던 어린학생을 무시하고 스쳐지나간 버스처럼, 두려움과 슬픔을 던져주는 사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해 갑오년에는 대면하는 모든 현상이 단순히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마인드보다는 인간적 배려를 지닌 성자다운 어머니처럼 심리적 무의식이 개별적으로 잠재되기를 바란다. 진정성아래 일상생활 속에서 허물없이 만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삶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잠깐의 불편함을 서로 극복하는 행동과 도덕적 의식이 확대되는 사회가 이뤄지기를 꿈꾸어 본다.
-
대학생 겨울방학 기간 알차게 보내기2014.01.08
-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