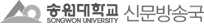겨울이 깊어져 눈이 내리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 앞 동네 길과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건만, 흰 눈은 어느새 훨훨 춤을 추며 내려와서,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란 참으로 이 세상의 곳간에 쌓여둔 쌀보다도 훨씬 많은가 보다. 이십여 평 차지하는 마당이건만 눈 내리는 날이면 시중이 만만치 않다.
동네길, 마당, 제일 귀찮은 길이 장독대로 가는 길이다. 장독대 길은 겨울 한철 내내 온통 흰 눈으로 둘러싸고, 장독 위 측면의 붉은 빛만 남기고, 온 집 뜰을 통째로 하얗게 변해 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절반 이상 녹아버리고 지저분한 흙과 섞여 누추하게 드러난 나무 밑줄기를 둘러 칠 때쯤에는, 벌써 다시 거들떠볼 눈길조차 없는 것이다. 꼴불견 같이 된 것이 바로 그 눈이다. 가령, 정미소에서 갓 나온 쌀같이 신선하게 하얀 색깔을 띤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칙칙한 흙색으로 혼합되어, 볼품없는 그 많은 눈은 초가집 지붕 낙숫물 흐르는 곳에 뭉쳐 흙과 혼합되어 보기 싫은 까닭에, 아무래도 뭉쳐놓은 눈덩이를 족족 그 뒷시중을 해야 한다.
처마 밑에 모아놓은 흰 눈덩이로 고드름이 떨어지면, 들쭉날쭉 솟아오르고 파이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이면 눈을 치우기 위한 삽질은 무척 힘이 들고, 어느덧 앞마당은 보기 싫게 채색되어 버린다. 눈이 녹아 흙탕물과 섞인 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있을까? 호박덩굴 뿌리 주변에 뿌린 뒷물과 같다. 참새가 날아온다. 짚망태에 나무를 괴고 새 모이를 뿌려놓아 새끼줄을 연결해 놓고 갑자기 끌어당겨 참새를 잡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다.몰래 숨어 구멍을 통해 확인한 다음, 별안간 맹렬한 속도로 새끼 줄을 잡아당긴다. 참새는 날쌔게 빠져나와 옆 나뭇가지로 날아간다.
나는 그 광경을 한없이 즐기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주제를 중요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빛과 색채와 형체가 희미해지고, 흰 빛이 어스름하게 그 빛을 감추어 버린 희망을 잃은 허전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희망의 껍질인 눈을 쓸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벼 그루터기가 드러난 들판은 벌써 희망을 담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탓일까? 반짝반짝한 눈(雪)빛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린다. 벌써 기억에 잠기고 회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겨울이다! 겨울은 추억을 먹고 사는 시절이다. 나는 텃밭의 가장자리에 깊게 파고, 기다란 독 항아리를 푸른 희망의 항아리를 땅속 깊이 파묻고 활발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동화 속의 소년같이 활발하고 힘차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처 없이 스스로 공동우물물을 길고 혼자 아궁이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희망의 감격에서부터다. 부엌에 묻어놓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즐겁거니와, 맞바람에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에 벼 짚을 태우는 것도 기뿐 일이다. 연기로 가득 찬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무기를 돌리며, 어렵게 타오르는 불꽃을 동심의 감동으로 바라본다. 자욱한 연기 속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갛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은, 그 무엇을 토해내고 솟구치는 자랑스러운 신령 같다.
이마와 볼을 벌겋게 변색시키면서 여유로운 자태로 웅크리고 있는 내 모습은, 흡사 그 고귀한 미술품을 건네받는 감동적 환상의 장소인 것과 같은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아궁이 불의 자태를 극찬하면서, 동화 속의 왕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좀 있으면 가마솥에는 증기기관차처럼 김이 활기차게 품어 낼 것이다. 연기 가득한 부엌에 숨어있다는 것이 동화 속의 느낌으로 마음을 품으면서 누룽지 숭늉을 마시는 속에, 바로 유토피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낙원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초가집 부엌이 바로 그곳인 것이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결국 불과 물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유토피아적 음식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닐까? 물과 불 이 두 가지 속에 우리의 생활은 만들어진다.
생활의 의욕이 가장 활발하게 표현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어느 시절 어느 곳에서나 거의 같은 느낌이기는 하나, 차가운 겨울에도 향기를 잃지 않고 가장 활기찬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여유롭고 추억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궁이 불은 활활 타야하고, 굴뚝에선 연기가 뭉게뭉게 올라와야 하고, 검은 숱의 물은 펄펄 끓어 숭늉을 만들어야 한다. 시골장터에서 사온 꽁치를 망태 속에 넣어가지고 버스 속에서 비릿 내를 풍기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러한 모습이 어부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바닷가에 앉아있는 노인 같다고 또 즐기면서 이것이 내 어린 시절의 생활상이라고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동치국물을 마시면서, 그때까지 생각한 것이 어릴 적 생활의 기억이다. 벌써 차가워진 주전자의 물은 얼음이 얼었고, 윗목에는 올 겨울에도 또다시 콩나물 기르는 시루를 설치한 것을 생각하고, 눈이 오면 누님 같은 눈사람을 세울까 궁리도 해 보곤 한다.
이런 공연한 생각을 할 때만은 근심과 걱정이 봄바람에 눈 녹듯 사라져 버린다. 나의 시작詩作은 시작되어 백지에 써 내려가며 감상적인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에 잠기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며 별일 없으면서도 부단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러한 생활의 일이라면 촌음을 아끼고, 앞마당의 쌓인 눈을 치우는 것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비경제적 관념을 품고, 오히려 그런 비생산적 생활에 창의적 경제적인 이념을 창조하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일까? 시절의 탓일까?
아마 깊어가는 겨울의 이 하얀 들판이 한층 추억과 행복한 느낌을 가지도록 느끼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
사랑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비법 '남자사용설명서'2013.03.18
-
<박사가 사랑한 수식> 토목공학과 1/김재식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