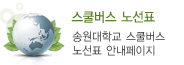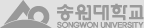송원뉴스

송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영일 관장
2016.12. 21.
창가에 서서 서쪽 끝으로 떨어지는 세모의 해를 바라보니 내 마음도 따라가고 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삭풍으로 쌀쌀함이 가득하여 지난 계절을 무시하고 먼저 와버린 느낌이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마지막 달력을 넘기기가 힘들다.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의 거리는 속울음 흐느끼며 영혼의 함성처럼 들려오는 상념들이 지난 잘못된 삶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꽃도 나뭇잎도 햇빛도 없이 빈 가지에 앙상하게 달린 고엽(枯葉)처럼 쓸쓸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끝도 시작도 없이 심신은 피곤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느낌이다. 아니 세월이 내 안에서 급속히 빠져 달아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보이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광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다. 안개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우리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 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인다.
그렇지만 세모 풍경을 정겹게 자아내는 자선냄비와 같이 온정의 온도는 그래도 식지 않고 있어 누군가에게 따습고 위로의 길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 삶에 있어서 겨울바람은 손 그리고 발가락만 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마음도 그 속에 겹겹이 깊게 숨겨진 사랑까지도 시리게 만든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한 삶을 덮어주는 역할에 충실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라고 윤동주 시인은 답한다.
이제 달력 한 장이 문틈으로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도 팔랑거리는 시간인데 한 해를 채운 가슴은 내 놓을 수 없다. 마지막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으로 조용히 바꾸며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라고 말하고 싶다. 나를 전부라도 태워, 너의 시린 손 녹여줄 따스한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지켜드리고 싶다. 어느 날 말없이 내 가슴속 가득 채워진 사랑처럼 그렇게 약속도 없이 창밖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옛날 겨울밤은 지금보다 유독 눈이 많이 왔다. ‘십이월이 좋다// 어린이처럼/ 눈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기에//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이 좋다// 변두리 가슴만 찾아다니며/ 이쪽저쪽 휘저어가면서/ 붐비는 자태가 아름답기에// 초가집 처마/ 호롱불 밑에 붐비고/ 장독대 위에 붐벼서 좋다// 난,/ 늦은 저녁때 오는/ 십이월 눈발이 참 좋다’라는 자작시를 낳게 하였다.
‘벌써’라는 말을 떠올리며 맞이한 12월이 오는 듯 가고, 머문 듯 스쳐가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며 나는 무엇으로 살아 어디에 와 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지난날 세모의 강 따라 내 마음도 함께 흐르며 텅 빈 들녘을 어루만지고 나에게 그토록 가슴 시리게 소중했던 것들을 당신과 주고받은 일상의 나눔과 함께 또 다른 태양이 있는 내일로 열린 마음 가득 담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듯한 세모의 엽서 한 장 보내 드리고 싶다.
‘누가 다녀갔는지, 이른 아침/ 눈 위에 찍혀 있는/ 낯선 발자국// 길 잘못 든 날짐승 같기도 하고/ 바람이 지나간 흔적 같기도 한// 그 발자국은/ 뒷마당을 조심조심 가로질러 와/ 문 앞에서 한참 서성대다/ 어디론가 문득 사라졌다’ 전동균 시인의 ‘동지 다음날’에 나오는 시이다.
동토는 입을 다물고 흐린 그림자는 말을 삼키며 삼라만상은 죽은 듯 마비되어 있으나 그들마다 독백하고 연마하여 새로운 봄에 수많은 언어들을 토해낼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내 곁에 이웃을 생각하며 천사처럼 살수는 없어도 마침표 없는 작은 봉사의 삶은 살 수 있다. 말이 넘치는 시대에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며 혼자만의 행복보다는 타인들과 더불어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면서, 순간의 만남이 영원한 진리가 되듯이 내 가슴 속에 양심의 소리가 진실한 메시지이기를 원한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한 해를 보내고 싶다.
-
송원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전 본격추진2016.12.23
-
뷰티예술학과 박장순 교수 광주매일 기고2016.12.16














.png)